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미스터리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미 부도 상태나 다름없는 동양그룹이 발행한 CP가 오히려 더 많이 발행되고 팔린 것이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동양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람들은 모조리 '개미 투자자'들이었다. 금융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간 시장에 개인들이 뛰어들었다가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업계는 모두 알고 있었던 '휴지조각 동양 CP'를 개인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높은 금리의 유혹이 컸을 것이다. 은행 예금금리가 연 3~4%인데 3개월 만기 CP를 눈 딱 감고 네 차례 정도 돌리면 연 9~10% 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1972년 한국 경제의 지축을 뒤흔든 '8.3 사채동결 조치' 당시 은행과 사채시장 금리 격차가 딱 2배 정도였다.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바라고 기업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였다는 점에서는 외형상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당시 사채시장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원금까지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동양그룹 CP를 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양증권이 CP를 팔면서 "절대 부도날 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강조했을 가능성이다. 이 같은 판매방식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사실상 부도 상태인데도 "부도가 안 난다"면서 판매했다면 명백한 사기인 것이다. 사기성 판매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동양증권과 대주주에게 철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고 이들이 마지막 한 푼까지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조치해야 한다.
주식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벤처시장, 제3시장 등을 구분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익률과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제에 CP나 유사한 특징을 가진 금융상품 역시 위험등급별로 시장을 따로 만들어 투자자들이 '위험시장'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근원적으로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보완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동양그룹 CP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데스크칼럼]반면교사 삼아야 할 영국의 에너지 정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1041811144032957_1.jpg)



!["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어하우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52812060486932_1716865565.jpeg)
!["노인 보기 싫다" 민원에 창문 가린 요양원…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시니어하우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52815443887264_171687867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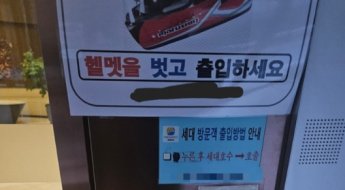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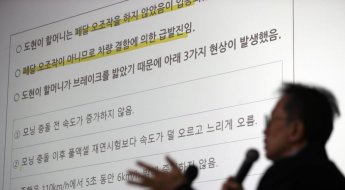








![[시시비비]기생수와 민희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52909485135323A.jpg)
![[기자수첩]檢, 카카오 수사 서두르더니 재판은 느긋](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52910441946813A.jpg)
![[초동시각]고환율 시대의 안전판 '서학개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52906400793176A.jpg)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52913225588618_1716956574.jpg)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52814342187134_1716874461.jpg)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52701130884679_1716739989.jpg)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2032415383891705_1648103918.jpg)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208272146743_1713742041.jpg)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52409375283147_1716511072.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