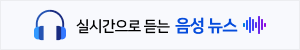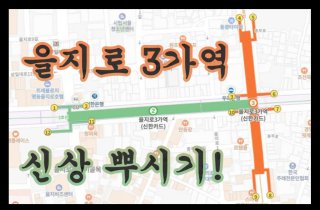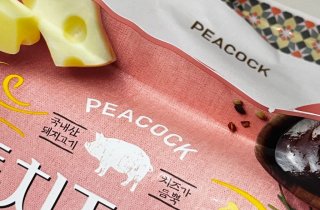세금은 대부분 '소득=소비+재산'이라는 세 가지를 주된 세원으로 한다. 이 중 소득 및 소비와 관련된 세제의 기초를 놓은 장본인이 박정희다. 그는 1976년 종합소득세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직접 증세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나라의 산업화에 필요한 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직전년도 2000억원이었던 소득세 세수가 3300억원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소비세도 7700억원에서 1조원으로 30% 이상 더 걷혔다.
30여년 남짓한 세월이 흘러 이제 그의 딸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으로 뽑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135조원은 세출 예산 중 80조원을 줄이고 세제를 고쳐서 55조원을 간접 증세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정철학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정책 지향점의 차이다. 박 전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데 비해 박 당선인은 '현재' 고령층을 위해 세금을 쓰려 하는 것이다. 법률제정 목적이 다른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을 통합까지 하려 든다. 물론 취지야 십분 이해되지만, 나라의 중심축인 청년층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셋째, 통일에 대한 준비성 차이다. 적어도 박 당선인의 예산 속에는 통일비용에 대한 고려는 그리 많지 않다. 이와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물론 여기에 방위세까지 신설했었다. 자주국방의 재원 마련과 통일비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살피건대 복지를 확대하되 적자재정을 편성하진 않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굳이 빙빙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세율 인상이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소득 3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38% 세율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 15억원 이상에 45% 정도의 세율을 적용시키면 몇 조원 정도의 추가적 세금 수입은 가능하다. 여기에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매년 10조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아버지가 만든 세제를 딸이 잘 보완해 운영한다면 훗날 역사가들로부터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실하게 다진 부녀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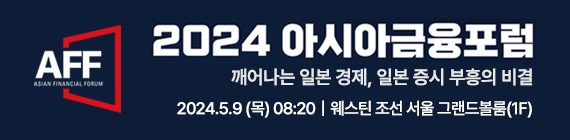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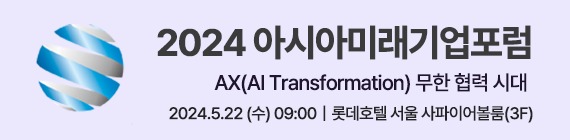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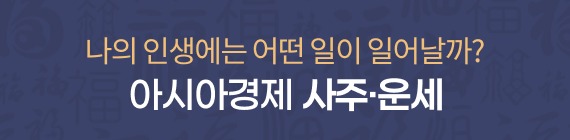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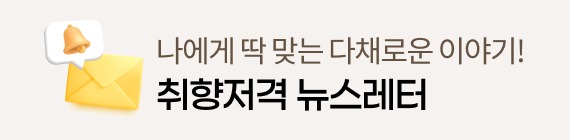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충무로에서]박정희의 직접 증세, 박근혜의 간접 증세](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3012911072818919_1.jpg)
![[충무로에서]금연·다이어트 계획 세우지 마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3012211164102821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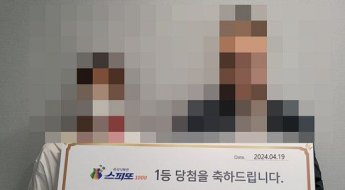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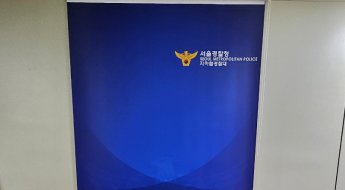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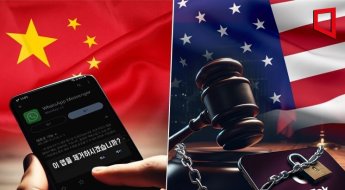

![[초동시각]제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511111216547A.jpg)
![[시시비비]경영권 지킨 디즈니와 'PC주의' 논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513390549754A.jpg)
![[특별기고]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주는 투자 기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513464837251A.jpg)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410323050257_1713922350.jpg)
![[포토] '그날의 기억'](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909431345253_1713487393.jpg)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808095443462_1713395394.jpg)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510502452065_1714009823.png)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415131250718_1713939192.jpg)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042111281396915_1682044092.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독]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2071509415251060_16578457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