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회수 위해 무기명 회원권 남발, 이용객 많을수록 적자 '기현상'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손은정 기자] 부킹, 말 그대로 티타임 예약이다.
골프장이 턱없이 부족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 근교의 선호 시간대를 예약하려면 거액의 커미션을 지불해야 했다. 부킹전용 전화가 등장했고, 브로커까지 존재했다. "부킹 담당자는 1년에 집 한 채는 거뜬히 장만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 '아주 특별한 회원권' 무기명= 시장의 수요는 충분했다. 1980년대 기흥과 뉴서울, 88 등이 강남의 명문으로 먼저 자리 잡기는 했지만 회원 수가 많아 부킹이 쉽지 않았다. 대안이 '회원의 날' 정도였다. 통상 한 달에 주말 2회, 회원들끼리 치는 날이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접대골프가 급증하면서 용인권에는 신원과 아시아나, 은화삼 등 이른바 신흥명문 '빅3'가 탄생했다.
월 2회 확실하게 주말예약을 보장해 주는 조건을 앞세워 최초의 억대 회원권을 분양했다. 하지만 회원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골프회원권은 기명식,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예약과 사용이 가능하다. 예약한 정회원이 입장을 못하면 예약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가 따르고, 무단으로 비회원에게 예약을 양도하거나 위임하면 패널티가 더 높다.
송용권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이사는 "외환위기 이후 회원권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신규 분양시장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있었던 시기"라며 "(무기명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비에비스타는 실제 회원권이 2억원이었던 2000년대 초반 무기명을 무려 8억원에 분양했고, 호황기 때는 30억원까지 올랐다. 지금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계열의 파인크리크 20억원, 프리스틴밸리와 아난티클럽서울 등도 10억원에 육박하던 시절이었다.
▲ "골프장 경영은 어떡해"= 가격이 너무 높아 아무나 구입할 수 없었던 무기명은 그러나 신설골프장에서 투자비 회수를 위해 남발하면서 그 가치가 떨어졌다. 법인 수요를 위해 출발했지만 한계에 이르자 타깃을 개인까지 확대하면서 특혜는 많아진 반면 가격은 낮아졌다. 골프장으로서는 당장 투자비 회수가 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운영 적자를 가중시키는 주요인이 됐다는 이야기다.
무기명의 남발은 주중으로도 이어졌다. 비에이비스타에 이어 휘닉스파크와 남춘천, 로얄포레 등이 합류했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갖가지 특혜가 더해진 것도 나중에 '부메랑효과'로 돌아왔다. 관련업계에서는 "주중회원권의 경쟁자는 타 골프장이 아니라 은행의 이자율"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
지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골프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00골프장이 이상하다. 4억, 5억짜리 무기명을 남발하더니 요즈음은 조건을 살짝 변경해 2억5000만원에 분양한다. 나도 이곳 무기명이 있는데 가을에는 평일, 주말 통틀어 00(계열골프장) 부킹도 못해봤다.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들어가도 자리가 없다. 그런데도 부킹을 보장한다며 계속 분양하고 있으니 이판사판인가?"
댓글이 더 가관이다. 한 네티즌이 "(해당 골프장에) 부킹사이트를 이용해 그린피 10만원에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했다. 회원도, 그것도 일반 회원보다 입회금이 더 높은 무기명 보유자도 예약이 안 되는 마당에 비회원에게 예약시간을 내 준 셈이다.
무기명 회원은 그린피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이 많을수록 골프장으로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분양은 했지만 비회원을 받아야 그나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관련업계에서는 "(해당 골프장은) 주말에 손님이 꽉 차도 하루 매출이 몇천만원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며 "매출 때문에라도 회원 입장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손은정 기자 ej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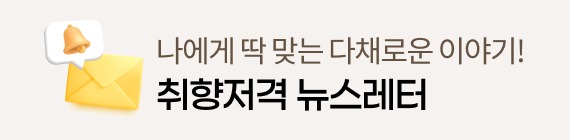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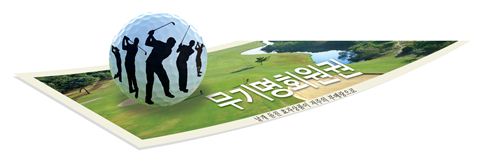
![[한국골프장의 허와 실] "시대의 불운, 경춘골프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3121210383693702_1.jpg)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떠름'[1mm금융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409401750069_171391921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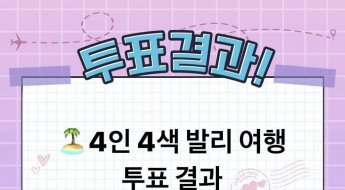

![[기업&이슈]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핵심 된 '옵션' 계약 뜯어보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07305853105_1714084257.jpg)





![[초동시각]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좀비기업 청산부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10515919958A.jpg)
![[시시비비] '4월 위기설'은 끝나지 않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10302924644A.jpg)
![[시사컬처]뉴진스보다 신데렐라였던 민희진의 운명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11443372329A.jpg)







![[포토] '벌써 여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615260154090_1714112761.jpg)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410323050257_1713922350.jpg)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510502452065_1714009823.png)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415131250718_1713939192.jpg)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042111281396915_1682044092.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명품백, 직원가로 해드릴게요" VIP고객에 24억 등친 백화점 직원 [경제범죄24時]](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0062511162025619_1593051380.jpg)




![[포토] '벌써 여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615260154090_17141127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