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빚에 폭설까지 쌓인 불황골프장의 '비명소리'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추위에 손님이 확 줄었는데 폭설까지 내렸어요."
강원도 홍천의 고지대에 위치한 한 골프장. 지난 10일 새벽 쏟아진 눈이 코스를 하얗게 뒤덮었다. 진입로까지 막히면서 직원들조차 오도가도 못 하는 신세가 됐고 예상보다 이른 휴장계획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비단 날씨 때문만이 아니다. 경춘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이 일대에 몰려든 골프장들이 경영 악화로 너나 할 것 없이 신음하고 있다.
임페리얼호텔 계열사인 힐드로사이와 대명리조트가 지은 소노펠리체, 미래에셋의 블루마운틴 정도가 자기 자본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나머지는 돈을 빌려 골프장을 지었다는 이야기다. 홀당 건설비용이 줄잡아 30억원, 18홀일 경우 540억원이 든다. 여기에 클럽하우스 건설비용 300억원, 카트 등 기타 설비 100억원을 더하면 일반적으로 1000억원이 투입된다.
거액의 뭉칫돈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은 분양이 잘 되던 호시절과는 달리 높은 이자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2년 전 저축은행 사태가 골프장 건설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다. 회원권 분양이 애를 먹자 결국 지급보증을 섰던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대신해 골프장을 떠안는 현상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클럽모우는 올해 초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PF보증금 1300억원과 공사대금 900억원 등 2200억원을 고스란히 넘겨받았다. 파가니카는 대우건설, 산요수는 코오롱건설, 오너스는 현대엠코 등 시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골프장 빚을 떠안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의 아들 현석씨가 운영하는 춘천의 더플레이어스도 자본 잠식상태다.
이처럼 2000년대 후반에 건설된 골프장은 분양에 허덕이며 존폐여부가 불확실하다. 그 이전 골프장들은 분양가가 낮아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위안거리다. 최소한 입회금 반환사태는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억원까지 올랐던 라데나는 1억원을 밑돌고 있고, 8억5000만원에서 고점을 찍었던 마이다스밸리는 2억원대, 6억원이 넘던 프리스틴밸리는 1억원대로 추락했다. 분양이 아닌 시중에서 고가로 매입한 보유자들은 이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손은정 기자 ej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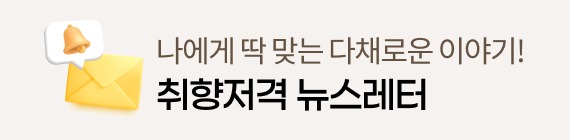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한국골프장의 허와 실] "시대의 불운, 경춘골프장"](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3121210383693702_2.jpg)
![[한국골프장의 허와 실] 2. 여주는 '한숨선', 경춘은 '통곡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3121210554533301_2.jpg)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떠름'[1mm금융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409401750069_171391921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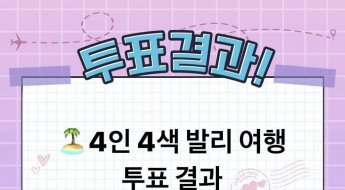







![[초동시각]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좀비기업 청산부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10515919958A.jpg)
![[시시비비] '4월 위기설'은 끝나지 않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10302924644A.jpg)
![[시사컬처]뉴진스보다 신데렐라였던 민희진의 운명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11443372329A.jpg)







![[포토] '벌써 여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615260154090_1714112761.jpg)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410323050257_1713922350.jpg)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510502452065_1714009823.png)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415131250718_1713939192.jpg)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042111281396915_1682044092.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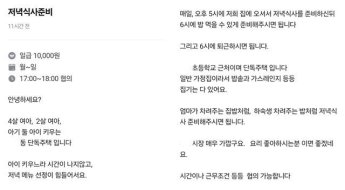
![[포토] 파워에이드,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캠페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811311754690_1714271477.jpg)

![[포토] 파워에이드,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캠페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811311954692_1714271479.jpg)
![[포토] '벌써 여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615260154090_17141127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