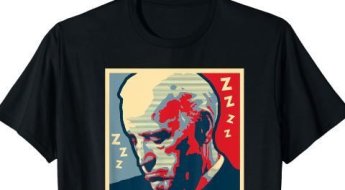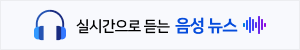바람직한 방향이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대기업 노사 위주로 꾸려져 다양한 노동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사문제 전반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과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등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 고용 분야 의제까지 다루기로 한 것은 고용률 70% 등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어느 것 하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 5월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과 정년 연장 등의 큰 틀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선 여전이 이견차가 크다. 자칫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골만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노사정위는 민노총의 이탈 속에 협상력을 상실한 '식물기구'라는 평까지 듣고 있는 처지다. 노사정위 행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노사정위의 향후 역할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하르츠 개혁, 바세나르 협약으로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노사정위가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 낸다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고 경제 성장동력도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단시일 내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 과욕을 부릴 일은 아니다. 당장은 민노총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등 대타협으로 가는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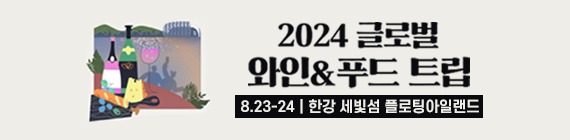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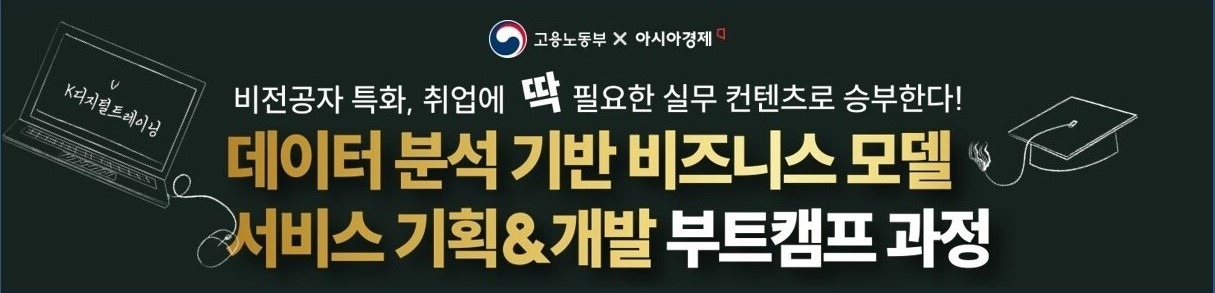
![[조문환의 평사리日記]달빛유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3072611213459756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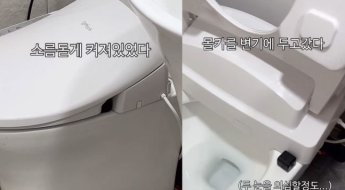













![[시론]유전자도 힘이 다했다, 힘든 한국 미래를 보여 줄 올림픽](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72611142066017A.jpg)
![[초동시각]국민주는 왜 나락으로 떨어졌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72611062907158A.jpg)
![[기자수첩]등돌린 주주, 잃어버린 신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72511031837177A.jpg)




!['희소병 투병' 셀린 디옹 컴백할까…파리목격담 솔솔[파리올림픽]](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72508543963687_1721865279.jpg)

![[포토] 찜통 더위엔 역시 물놀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72614193365988_1721971172.jpg)
![오륜기에 보름달이 '쏙'…에펠탑 '달빛 금메달' 화제 [파리올림픽]](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72608213965317_1721949699.png)
![[포토] 복날,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72512554064324_1721879740.jpg)



![[뉴스속 용어]프랑스 자유와 혁명의 상징 ‘프리기아 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72612264765891_1721964407.jpg)
!['손절'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캔슬 컬처'[뉴스속 용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72513385964389_1721882339.jpeg)
![[뉴스속 용어]티몬·위메프 사태, ‘에스크로’ 도입으로 해결될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72414374763016_1721799467.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