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결혼이민자 중 77% 여성
언어·문화 차이에서 어려움 느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한국에서 사는 타하라 사유리씨(42)는 설 명절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아직 한국어가 서툰데 연휴 내내 시댁에서 지내야 해서다. 의사소통도 어렵고, 다른 며느리들처럼 친정을 갈 수도 없다. 사유리씨는 “형님들은 명절에 일도 잘 도와드리고 친척들과 대화도 잘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서 같은 며느리로서 스스로 비교하게 되고 자신감도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연휴가 마냥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다문화가정의 며느리들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에 친정이 없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연휴 기간 내내 시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친정이 있는 고향에 다녀오거나 다른 이주 여성들과 모임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시간 혹은 경제적 여건 탓에 그마저도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다. 많은 가족과 지내야 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이들에게는 명절 연휴가 유독 길게만 느껴진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1월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수는 2019년부터 꾸준히 17만명대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22년 기준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은 약 77%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소한 언어와 문화 탓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에서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지난해 진행된 상담 약 21만건 중 5만5000건이 언어와 관련된 문의였다.
이 같은 고민은 직계 가족은 물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 더욱 도드라진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 10년 된 도 도틴씨(35·가명)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 애를 먹었다. 도틴씨는 “처음에 한국 음식도 못 먹고, 한국어도 못해서 설날이나 추석 때 시댁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살펴봐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이유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1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언어 장벽이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결혼 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 실태에서도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지원’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 생활 12년 차인 타나카 치애씨(39·일본)도 한국으로 처음 시집왔을 때를 떠올리곤 한다. 치애씨는 “처음에는 한국 음식 레시피도 모르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아 도움이 못 돼 미안한 마음뿐이었다”면서 “시댁 식구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어를 잘못 말해 실수할까 봐 마음을 졸이곤 했다”고 말했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다. 황 비키씨(39·중국)는 아이를 출산하고 명절이 더 힘들어졌다고 고백했다. 비키씨는 “아기 키우는 방법에도 문화 차이가 있고 세대 차이가 있는데 시댁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해서 불편했다”며 “생활 습관 차이, 애들 먹이는 방법부터 빨래하는 방법까지 다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제결혼과 결혼 이민의 증가로 이른바 ‘글로벌 빌리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언어와 문화 등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명옥 서울 성북구 가족센터 다문화사업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결혼 이민은 물론 신규 입국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들이 초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통·번역 지원이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우 다문화융합연구소 교수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지는 않다”면서도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원활한 가족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외친 美석학…"돈 준다고 ...
마스크영역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외친 美석학…"돈 준다고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21016211960558_1707549680.jpg)
![명절 음식 체험에 나선 결혼이주 여성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사진=아시아경제DB]](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3091322295144201_1.jpg)







![이게 왜 진짜?…인천공항 내부서 테니스치는 커플[영상]](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61310030015099_17182405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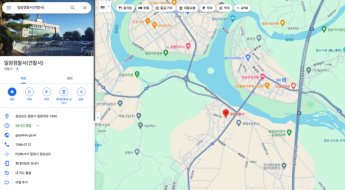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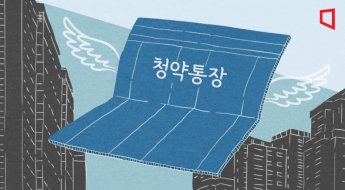





![[초동시각]법, 많이 만드는 게 능사 아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61309480788345A.jpg)
![[시시비비]무엇을 위한 지구당인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61310093228215A.jpg)
![[기자수첩]최저임금위, 올해도 소상공인 울릴 건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61311280847625A.jpg)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61310154615165_1718241345.jpg)
![[포토] 시원하게 나누는 '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61211082413785_1718158104.jpg)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61110361612121_1718069776.jpg)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2050709291858154_1651883359.jpg)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60715292898848_1717741768.jpg)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60516103597388_1717571435.jpe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