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원제 운영, 회원권은 거래 안 돼 "차별화로 품격 높였다"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한국의 오거스타' 안양골프장.
앞서 소개한대로 대기업들의 골프장사업 전략은 '차별화'다. 최고의 명코스를 조성해 불황과 상관없는 '블루칩'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안양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코스리뉴얼에 650억원을 들였지만 회원모집 등 투자비 회수는 일체 없다. 그저 45년의 역사에 수려한 코스, 첨단서비스를 더해 '골프종가'의 자존심을 지킬 뿐이다. 입장객을 제한해 해마다 적자가 나지만 이 또한 상관없다. 연회원제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퍼들에게는 '영원한 로망'이다. 회원권이 거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 재계 인사들을 총망라한 미국의 오거스타내셔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골퍼들은 결국 회원의 초청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다. 걸어서 라운드하고, 캐디 2명이 완벽하게 플레이를 보조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골프계에서 "안양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도 20억원이상의 회원모집도 가능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번 리뉴얼도 클럽하우스 신축에 300억원, 최고 1000억원까지 쏟아 붓는 현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왜소하다. 불편함을 없애는 정도, 다시 말해 화려함보다는 품격이 핵심이다. 코스 개, 보수도 1, 5, 16, 18번홀 등 4개 홀에 그쳤다. 그린은 그러나 18개 홀 전체에 '서브에어시스템'을 적용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파이프를 깔아 통풍을 강화해 혹서기에는 그린 보호, 장마철에는 배수와 건조 효과를 발휘한다.
실제 9분 간격의 넉넉한 티오프에 입구부터 시작되는 '메스클루시버티' 서비스, 골프장 텃밭에서 가꾼 유기농채소와 4만병의 와인저장고 등 무엇 하나 떨어지지 않는 품위를 앞세워 벌써부터 '골퍼들의 버킷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개인 13억원의 초고가 회원모집에 성공했지만 입회금 반환과는 거리가 먼 까닭이다.
경기도 이천의 트리니티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코스디자이너 톰 파지오 2세가 심혈을 기울인 코스와 18개 홀 그린의 '서브에어시스템', 클럽하우스 옆에 천연잔디연습장까지 있다. 회원모집 대신 국내 최고의 인사 200명을 엄선해 1년간 회원대우를 해주는 아주 특별한 마케팅기법도 관심사다. 골프장을 이용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자신감'이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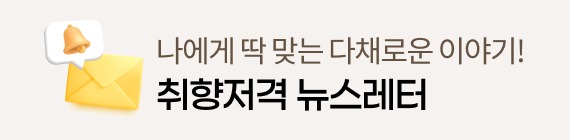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한국골프장의 허와 실] 5. 골프明堂 '삼성 5걸'은 불황도 날린 빅 샷](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3122410294720974_3.jpg)

![해지한다고 하면 '혜택' 와르르? 장기 고객일수록 손해[헛다리경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523272353043_17140552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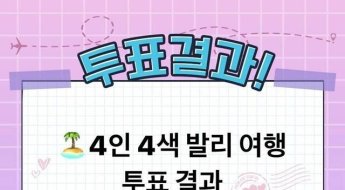








![[초동시각]K-팝 ‘멀티레이블’의 성공과 한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911393264840A.jpg)
![[기자수첩]저출산 대책, 해법은 없고 검토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911072459763A.jpg)
![[시론]이재명과 조국의 의도된 오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910350707293A.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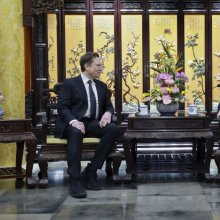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908540855266_1714348448.jpg)



![[포토] '벌써 여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615260154090_1714112761.jpg)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510502452065_1714009823.png)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415131250718_1713939192.jpg)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042111281396915_1682044092.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기차 열풍에 눈물 나는 공업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11374853744_1714099069.png)




![[포토]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910115055552_1714353111.jpg)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하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910102555543_1714353026.jpg)
![[포토] IT-반도체 관련 채용 상담 받는 국군장병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910093955531_1714352978.jpg)
![[포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참석하는 추미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915082255971_17143709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