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올 상반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800만대 수준에 그치면서 휴대폰 제조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실 구매가격이 높아진 데다 경기부진 등이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이동통신·전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 판매량은 800만대(소비자 실 판매 기준) 전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된다. 월별로 적게는 120에서 많아야 150만대를 기록한 결과다.
이마저도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 보급형 스마트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제조사들에게는 악재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6%에 머물던 저가(34만5000원 미만)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단통법 시행 이후 18%로 증가했다. 출고가가 31만9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 그랜드 맥스'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줄곧 판매량 순위 5위 안에 들고 있다.
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반토막이 났다. 연 1200만대에 달하던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연 600만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시장 판매의 70% 이상이 프리미엄 단말기였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급감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30~40%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든 데다, 이 가운데 이익률이 높은 프리미엄폰의 비중도 크게 줄고 있어 제조사·이통사 모두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내 제조사 프리미엄폰의 실 구매가가 단통법 시행 전보다 높아지면서 정작 국내 소비자들의 프리미엄폰 구매 선택의 폭이 줄어 소비자에게도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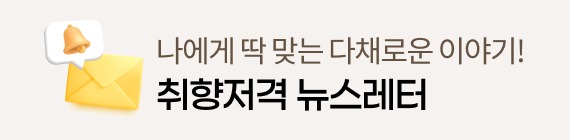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떠름'[1mm금융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409401750069_171391921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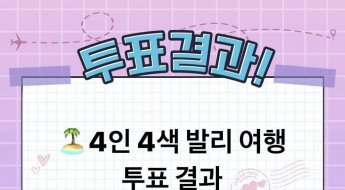








![[초동시각]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좀비기업 청산부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10515919958A.jpg)
![[시시비비] '4월 위기설'은 끝나지 않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10302924644A.jpg)
![[시사컬처]뉴진스보다 신데렐라였던 민희진의 운명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611443372329A.jpg)






![[포토] '벌써 여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615260154090_1714112761.jpg)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410323050257_1713922350.jpg)
![[포토] '그날의 기억'](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909431345253_1713487393.jpg)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510502452065_1714009823.png)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415131250718_1713939192.jpg)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042111281396915_1682044092.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