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F1은 4개 대륙에서 한 해 17라운드의 대장정을 치른다. 이 가운데 유럽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까스로 절반 정도다.
여기에 30년 전부터 F1을 개최해온 일본과 신규진입을 눈앞에 둔 인도까지 합하면 아시아 지역 그랑프리는 모두 8개가 된다. 이는 현재 유럽 지역이 차지한 개최국 수와 같은 규모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에 가까운 호주나 동서양의 관문 터키 등 중립지역 그랑프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아시아가 F1의 주역이라 해도 좋을 정도다.
아시아가 F1을 끌어 당기는 힘은 크게 두 가지, 돈과 시장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동차산업의 규모가 우리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일찌감치 F1을 유치한 것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노력이었다. 말레이시아의 F1 사업은 전 수상의 아들 마하티르가 설립한 SIC(세팡 인터내셔날 서킷)가 주도하고 있다.
이에 자극 받은 중국은 한 술 더 뜨는 투자를 했다. 2004년 F1 개최와 상하이 인근 자동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중국이 준비한 돈은 60억 달러가 넘는다. 상하이 서킷을 짓는 데만 3억 달러가 들어갔다. 역사상 가장 비싼 경주장이다. 물론 모든 비용은 정부가 마련했다.
F1의 운영권자인 FOM과 참가팀들은 중국 그랑프리에 열광 했다.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가져다 주는 거대한 시장규모 때문이다. 팀들은 상하이 서킷에 참가하는 것 만으로도 스폰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나라의 짝퉁 문화나 절망적인 자동차 기술 수준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일이다.
중국은 F1 유치를 통해 1억 5000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지만 F1팀이나 FOM 역시 짭짤한 재미를 보았다. 잠재적인 F1 팬 계층이 10억 명이나 늘었으니 말이다.
F1 개최국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한 것은 동아시아만이 아니다. 오일 머니로 돈방석에 앉은 중동의(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중동도 아시아다) 왕족들도 F1이라는 유럽의 문물로 황량한 사막을 치장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불을 당긴 것은 바레인이다. 바레인은 이 나라 황족들이 앞장을 서서 사막 한가운데에 서킷을 짓겠다는 (당시로서는) 황당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계획에는 걸프에어나 통신사 발텔코, 정유사 BAPCO 등 현지 대기업들이 대거로 참여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004년 중동 지역 최초의 그랑프리 유치국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람석 규모(4만석) 때문에 입장객은 다른 그랑프리의 절반 수준이지만 사회 상류층과 관광객들을 관중으로 끌어 들여 작지만 고급스러운 사막 그랑프리의 아이덴티티를 정립시켰다.
후발주자인 아부다비는 지난 2월초 사상 최고의 개최권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랑프리를 가져왔다.
아부다비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만든 서킷을 활용, 호화판 그랑프리의 실현을 꿈꾸고 있다. 유럽의 모나코가 그 모델이다. 기조 도로를 개조한 트랙이지만 웬만한 전용 서킷 건립비용 이상의 돈을 투입할 정도로 전면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아부다비의 의욕적인 투자를 지켜보면 F1이 종주국인 유럽을 떠나 사막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도 이해가 된다.
아시아의 약진은 F1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먼저 인구 통계적인 환경이 달라진다.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몰려있는 동아시아만으로도 주변 인구가 25억 명 이상이다. 현재의 유럽 전체 인구는 7억 명 안팎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인구 규모의 차이는 앞으로 F1이 백인이 아닌 황인종 중심의 문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한다.
F1이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지구촌의 축제로 거듭나게 된 것도 아시아의 힘이다. 자동차경주는 서구 자동차 문화의 발달사와 궤적을 같이 해왔다. 자동차로 레이스를 하겠다고 처음 생각한 주인공들은 유럽의 초기 메이커들이었고 이들간의, 혹은 유럽 내 국가간의 경쟁이 자동차 기술 발전을 북돋운 요인이었다. 이들의 넘치는 의욕을 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규정 모터스포츠가 바로 F1 그랑프리였다.
임혜선 기자 lhsro@
꼭 봐야할 주요뉴스
 '1박에 최소 70만원'…한국으로 몰려오는 글로벌 ...
마스크영역
'1박에 최소 70만원'…한국으로 몰려오는 글로벌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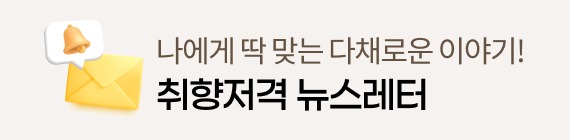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영암F1 D-8]아시아가 F1을 끌어당기는 힘](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010140606102548556A_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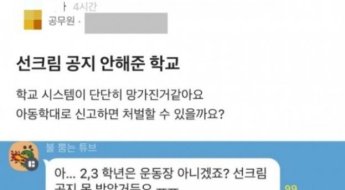


![청계천·탑골공원 '할배룩·할매룩'…외국 셀럽도 푹 빠졌다[청춘보고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50313042561023_1714709064.png)






![김남국 '우회 복당' 논란…민주당 복당 논란 이전에도?[뉴스설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3014494257530_1714456182.jpg)
![페스티벌의 계절…치솟은 티켓값에 '화들짝'[조선물가실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50216245659899_1714634696.jpg)
![[초동시각]의사단체들만 모르는 사면초가, 의료개혁 받아들여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50313332279757A.jpg)
![[뉴욕다이어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50509301806068A.jpg)
![[시시비비]데이터 생명줄 끊기는 이통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50310382053865A.jpg)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50315185461222_1714717134.jpg)





![[포토] '공중 곡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50309421760682_1714696937.jpg)
![[포토] 우아한 '날갯짓'](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50310424660856_1714700566.jpg)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50309175160594_1714695470.jpg)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3014175057442_1714454270.jpg)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510502452065_1714009823.pn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