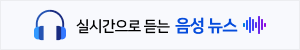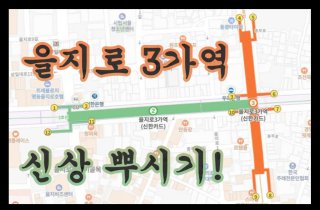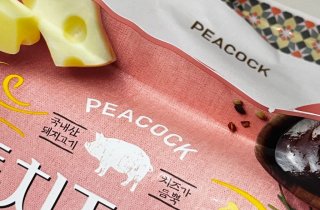산초를 깨물어 혀에 얼얼한 느낌이 번지는 동안 초림(椒林)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마침 식사 자리에서는 조선시대 역사가 화제로 오가고 있었다. 초림은 서얼(庶孼)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庶)와 얼(孼)은 모두 서자를 뜻한다.
서얼을 왜 초림이라고 했나? 서얼은 평생 얼얼한 자기네 삶을 곱씹으면서 맛이 얼얼한 산초를 떠올렸고, 그래서 산초의 초를 따서 스스로 초림이라고 불렀다. 서얼을 가리켜 '한 다리가 짧다'고도 말했다. 한 다리가 짧다는 건 모계를 비유한 말이다.
넉점박이도 서얼과 동의어였다. 서(庶) 글자에 점이 넷 있으니, 이 글자가 찍힌 처지를 넉점박이라고 한 것이다. (홍명희, 적서(嫡庶), 조선일보 1936.2.21) 요즘 사전에서는 넉점박이를 '두 눈과 코, 입의 네 구멍이 있다는 뜻으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는데, 이는 유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갖다 붙인 설명이다.
조선에서 서얼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다산 정약용 등 소수에 머물렀다. 임금이 서얼허통을 하려 했지만 적자 신하들의 반발에 막히곤 했다. 조선은 차별이나 편가르기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한 사회였다. 사색당쟁도 같은 맥락에서 빚어졌다.
한국사 교육이 강화된다고 한다. 한국사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밝은 부분과 함께 위와 같이 어두운 부분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것처럼 역사를 역사로 공부하는 길이다.
백우진 선임기자 cobalt1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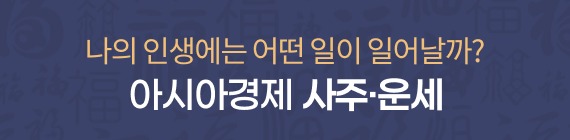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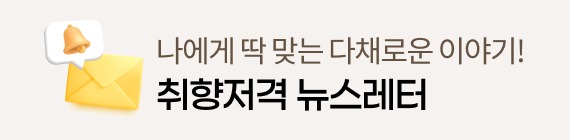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초동여담]콤플렉스에 대하여](https://cwstatic.asiae.co.kr/asiae_v2/common/no_img_rank.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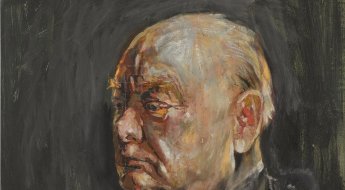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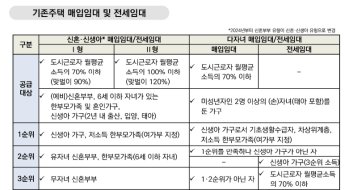

![[단독]늘어지는 재판…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들, 줄줄이 풀려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3102522440829064_1698241447.jpg)

![[논단]‘엄근진’ 보수정권의 착각](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711043304241A.jpg)
![[최준영의 월드+]남중국해 3국동맹과 韓의 고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711141454536A.jpg)
![[사사건건]사기방지기본법, 21대 국회 책임져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710504251920A.jpg)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1709294142287_1713313781.jpg)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610251540828_1713230715.jpg)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414024738504_1713070967.jpg)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0209062225653_1712016383.jpg)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3120715170080899_1701929820.jpg)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31909291699376_1710808157.jpg)
![[뉴스속 용어]정부가 빌려쓰는 마통 ‘대정부 일시대출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30512054984208_1709607949.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