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가 맞은 불행은 흑과 백처럼 더욱 도드라진다. 아니 백과 흑처럼. 1991년 여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고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다. 당시 그의 고통은 바닥을 짐작할 수 없어 가늠되지 않는다. 삶은 때로 설명하기 힘든 잔혹한 이빨을 드러내고 게걸스럽게 모든 것을 짓이긴다. 지독하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에, 어찌 보면 세상은 지뢰밭이다.
하지만 삶은 또 한 줄기 빛을 준비하고 있었다. 1993년 봄날에 그림이 취미였던 누나의 도움을 받아 연필을 입에 물고 시작했다. 그의 그림을 보고 부모님들은 울면서 웃었다고 한다. 축구가 사라진 자리에 그림이 들어왔다.
붓에 묶은 나무젓가락을 물고 그렸다. 입안이 부르트고 때론 피가 고인 채 그렸다. 미대에 들어갔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비장애인들의 손보다 그의 입은 위대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을 비롯한 여러 대회에서 수상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구필(口筆)화가 박정씨다.
그는 시선(視線)을 화두로 삼고 있었다. 여인이 관객을 물끄러미 응시하거나 어딘가를 바라보거나, 혹은 등을 돌린 채 바라본다. 묘하게 마음이 일렁인다. 화가의 표정은 그림만큼이나 고즈넉했다. 한때 저주했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그렇게 이제 평온을 찾은 듯 했다. 가을이 깊어간다. 나, 그리고 당신의 시선은…어떤가요.
박철응 금융부 차장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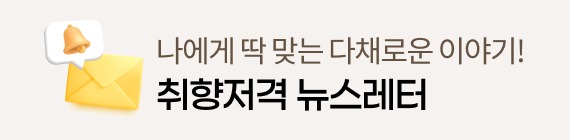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초동여담]면도하는 남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6100506535887179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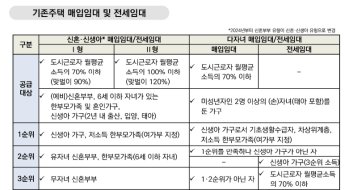

![[단독]늘어지는 재판…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들, 줄줄이 풀려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3102522440829064_1698241447.jpg)

![[논단]‘엄근진’ 보수정권의 착각](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711043304241A.jpg)
![[최준영의 월드+]남중국해 3국동맹과 韓의 고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711141454536A.jpg)
![[사사건건]사기방지기본법, 21대 국회 책임져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710504251920A.jpg)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1709294142287_1713313781.jpg)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610251540828_1713230715.jpg)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414024738504_1713070967.jpg)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0209062225653_1712016383.jpg)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3120715170080899_1701929820.jpg)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31909291699376_1710808157.jpg)
![[뉴스속 용어]정부가 빌려쓰는 마통 ‘대정부 일시대출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30512054984208_1709607949.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