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좀 많이 먼 것 같아요”
스스로도 ‘소는 누가 키울 거야’라는 그 평범한 말에 사람들이 왜 웃어주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그에게 ‘두분토론’으로 얻는 인기는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다. 남하당 박영진 대표의 캐릭터도 후배 김영희가 받아칠 것에 방점을 둔 소위 깔아주는 역할로 만든 것이었다. “저는 정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많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영진이 따먹고 있는 ‘두분토론’의 과실이 행운으로 보일 수도 있다. 처음으로 코너 아이디어를 내고 박영진을 합류시킨 김기열과 코너를 계속해서 다듬어준 제작진의 도움을 생각하면 더더욱. “‘소는 누가 키워’라는 멘트도 만약 감독님이 별로라고 했으면 아예 시도도 안했겠죠. 유행어로 만들겠단 생각도 없었고요. 운이 좋아 무대에 올린 건데, 몇 주 있다가 감독님이 다른 멘트로 바꿔보자고 했어요. 어차피 ‘일은 누가 할 거야’라는 뜻이었으니까 ‘감자는 누가 캘 거야’라는 식으로. 그 때 작가님께서 반응이 좀 오고 있으니 그냥 가보자고 하고 감독님도 오케이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행운이란, 때로 단순한 우연이 아닌 수많은 필연이 겹쳐지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재능을 넘어서는 의지, 어떻게든 웃겨야 한다
지금 ‘두분토론’으로 인기를 누리는 박영진을 그저 행운아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어디 건방지게 여자가 황도 먹으려고 술집에 와’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캐릭터는 역시 뻔뻔했던 그의 수많은 과거 개그가 누적된 본인의 캐릭터를 통해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때문에 깔아주는 멘트라 생각했던 것은 개그로 받아들여지고, 남하당 박영진은 메인 캐릭터가 된다.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유 없는 행운도 아니다. 그 수많은 경우의 수가 황금비율을 이룰 수 있는 건, 그만큼 이리저리 조합하고 고민하고 다른 이들의 조언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서다. 웃기는 걸 업으로 삼은 이들의 정점인 KBS 공채 개그맨들조차 소재 고갈에 허덕이고 여차하면 잊히는 게 이 바닥이다. 재능의 많고 적음 여부는 이미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웃겨야하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재능을 쥐어짜고, 여러 긍정적 요소가 더해질 때 비로소 한 코너가 방송을 타고 대중을 만날 수 있다. 여전히 박영진에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웃음은 신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런 해석의 맥락을 무대 위에서 연 건, 결국 아등바등 새 코너를 짜기 위해 노력한 자신이다. 신기한 결과란 사실, 신기할 정도로 노력한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10 아시아>와 사전협의 없이 본 기사의 무단 인용이나 도용,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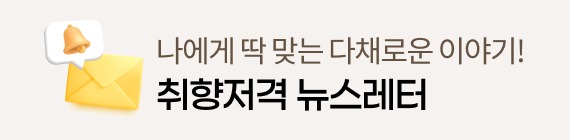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르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615111741444_1713247877.jpg)


![[시론]국민의힘 위기의 진짜 본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907435942966A.jpg)
![[디펜스칼럼]무섭게 성장하는 日 방산기업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911205793276A.jpg)
![[기자수첩]'기후플레이션' 보조금에만 기댈건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910292631627A.jpg)






![[포토] '그날의 기억'](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1909431345253_1713487393.jpg)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808095443462_1713395394.jpg)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709294142287_1713313781.jpg)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13008484747604_1706572127.jpg)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120715170080899_1701929820.jpg)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31909291699376_1710808157.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포토] 전남체전 축구 8강전 영광군 승부차기 끝 '짜릿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1916042045878_17135102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