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고 있었다 급히 흘러가는 개천을 가로질러 다리가 하나 있었다 우산을 쓴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빗속에 긴 새가 서 있었다 개천가에, 개천가에 긴 새가 서 있었다 걸음을 멈춘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보았다 긴 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불편했기 때문에 나는 왼쪽 어깨에 기대 놓았던 우산을 오른쪽 어깨로 옮기면서
저것은 새가 아닐지도 모른다 날개도 부리도 없는
어떤 느낌은 참 난데없다. '난데없다'는 갑자기 불쑥 나타나 그 출처를 알 수 없다라는 뜻이다. 이 시의 마지막 문장은 그야말로 그렇다. "난데없이 이건 또 웬 지옥인가 싶었다"라니. 그런데 시를 찬찬히 따라 읽어 가다 보면 그 사연을 조금은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물살은 급해졌고. 나는 그런 "개천을 가로질러" 놓인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개천가에 긴 새가 서 있었다". 아무런 미동도 없이 말이다. 게다가 그 새는 "날개도 부리도 없"다. 그러니 "저것은 새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 왔는데, 그런데 왠지 자꾸 마음이 불편하다. 혹시 그 개천가에 서 있던 게 날개를 다친 새였다면, 아니 실은 그 빗속에 "긴 새"처럼 어떤 사람이 우두망찰 서 있었던 거라면, 아니 아니 그보다 그 사람이 다급하게 흐르는 개천 속으로 긴 그림자를 앞세우고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라면, 정말 그런 거였다면, 정말 그랬다면... 어쩌면 단 한마디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 새를 아니 그 사람을 향해 단 한마디만 외쳤더라면, 우산 따위야 내던지고 그 개천가를 향해 달려갔더라면. 이 알량한 우산 밖의 저 지옥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채상우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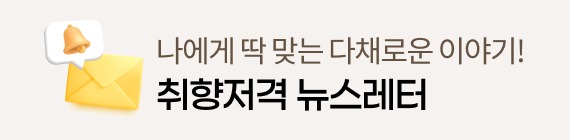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오후 한詩] 정지의 힘/백무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611070844496941557A_1.jpg)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운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409481650103_1713919696.jpg)










![[초동시각]젊은 공직자들의 이탈 막으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408324308168A.jpg)
![[논단]환율 위기 경계할 필요 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408350013985A.jpg)
![[MZ칼럼]전전긍긍하며 애쓰는 삶을 긍정하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410515686442A.jpg)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410323050257_1713922350.jpg)
![[포토] '그날의 기억'](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909431345253_1713487393.jpg)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808095443462_1713395394.jpg)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3042111281396915_1682044092.jpg)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13008484747604_1706572127.jpg)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120715170080899_1701929820.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