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진천 석현리 느티나무'와
'하동 축지리 문암송'의 신비
생명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혹은 고난투성이의 세월이 닥칠 걸 알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길을 찾는다. 생명의 본능이다.
나무는 살 자리를 옮겨다닐 수 없다. 그렇기에 긴 살림살이에서 삶을 향한 안간힘의 자취가 뚜렷이 남곤 한다. 누가 봐도 나무가 살기에 매우 불리한 터전에서도 뿌리 내리고 오랫동안 애면글면 살아가며 이룬 강인한 생명력은 볼수록 감동적이다.
지곡마을 어귀 자리잡은 느티나무
마을보다 100년쯤 전부터 자리해
바위에 뿌리 내리고 돌조각 움켜잡고
마을의 평안을 예언하듯 서있는 자태
충북 진천군 석현리 지곡마을 어귀의 낮은 동산에 서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도 그렇다. 멀리서 얼핏 보면 마을로 들어서는 길 어귀의 작은 동산에 우뚝 서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라는 데서 대개의 마을 당산나무나 정자나무와 크게 다를 것 없는 ‘그저 그런’ 느티나무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진천 석현리 느티나무’의 특별한 모습에서 큰 울림이 솟구친다. 나무는 더 가까이, 더 오래 바라봐야 하는 대상인 것은 이 때문이다. 동산 가장자리 언덕 위에서 겉으로 훤히 드러낸 뿌리들이 얽히고설키며 지어낸 만화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졸이며 오래 바라보게 만든다. 누구라도 눈을 떼기 힘들 만큼의 신비로운 자태다.
나무가 서 있는 자리는 ‘지새울’이라고도 불리는 지곡(知谷)마을이다. 700년 전쯤 처음 형성된 마을이다. 강릉김씨 김사혁(金斯革·?~1385)이 예순셋의 나이로 지문하부사상서(知門下府事尙書)로서 잠깐 머물 자리를 찾아 이곳에 들어온 게 마을의 시작이다. 김사혁은 고려 말에 홍건적을 격퇴하고 충청·전라 지역으로 침입한 왜구와 전쟁 중 큰 공도 세운 인물이다.
입향조(入鄕祖)가 된 김사혁은 특별히 미래를 예언하며 마을 살림살이도 이끌었다. 그의 예언 가운데 틀린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마을에 전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물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 알 지(知), 일 사(事)를 써서 지사울이라고 부르다 지새울로 변했고 나중에 지금의 ‘지곡’으로 마을 이름이 바뀌었다.
지곡마을 어귀의 진천 석현리 느티나무는 마을을 처음 일으킨 때보다 100년쯤 전인 800년 전부터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산림청에서 지정번호 ‘진천42호’의 보호수로 지정한 건 2000년 2월이다. 이때 이미 나무의 나이를 800년 넘은 것으로 측정했다. 처음 사람의 보금자리가 일궈지던 700년 전 나무는 이미 마을 어귀 동산에서 마을의 중심 노릇을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진천 석현리 느티나무는 다른 곳에 서 있는 비슷한 나이의 느티나무보다 높이나 줄기가 작은 편이다. 까닭이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이유다. 나무가 생명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뿌리 부분이다. 나무가 뿌리 내린 자리에는 큰 바위와 그 바위에서 쪼개진 것으로 보이는 돌투성이다. 나무에 온전히 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흙은 고작해야 바위와 돌들이 이룬 틈바구니에 존재할 뿐이다.
나무가 처음 뿌리 내린 자리는 얄궂게도 큰 바위 위다.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제 몸피를 키우고 하릴없이 바위를 쪼개야 했다. 하지만 바위가 쪼개지면 차츰 거대하게 자라나는 나무 줄기를 지탱할 뿌리의 터전은 허공이 되고 만다. 기반을 잃은 나무는 창졸간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무도 그걸 알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나무는 뿌리를 바위 위쪽으로 뻗어내 잘게 쪼개진 바위 조각들까지 단단하게 품었다.
쪼개고 품으며 살아온 세월이 800년이다. 돌아보면 나무는 ‘자라나는 일’보다 ‘살아남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했다. 나무의 몸피가 800년쯤 된 여느 느티나무에 비해 작은 건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작은 나무는 결코 아니다. 8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품은 여느 느티나무에 비해 다소 왜소할 뿐이다.
진천 석현리 느티나무는 높이 16m까지 솟아오르고 사람 가슴 높이께에서 잰 줄기 둘레가 6m에 이를 만큼 큰 나무로 자랐다. 필경 고난투성이의 세월을 품었으리라. 하지만 여전히 늠연한 자태는 잃지 않고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서 있다. 예전에 입향조가 그랬듯 옛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다가올 미래의 평안을 예언하는 것처럼 늠름하고 평안한 자태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느티나무는 그지없이 신비롭다.
바위에 터 잡은 또다른 나무 '문암송'
하동 축지리 대축마을 '경외의 대상'
옛 문인들 모여 詩會 열던 자리답게
저절로 글이 샘솟는 천혜의 정자
사실 흙 한 줌 없는 바위 위에서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게 아니다. 진천 석현리 느티나무 못지않게 바위 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나무는 적지 않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나무를 꼽자면 아무래도 천연기념물 제491호로 지정·보호하는 ‘하동 축지리 문암송’일 듯하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대축마을 뒷동산 기슭에 서 있는 이 소나무는 바위를 쪼개고 자라면서 매우 아름다운 수형까지 이룬 대표적인 나무다.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 위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를 바위보다 강한 나무라고 이야기한다. 나무가 자리 잡은 너럭바위를 사람들은 ‘문암(文岩)’ 혹은 ‘문바위’라고,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는 소나무를 바위 이름 따라 ‘문암송(文岩松)’이라고 부른다. 나무와 바위 모두 대축마을 사람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다.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악양들녘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경관 좋은 자리다. 옛날에는 문인들이 모여 시회(詩會)를 열던 자리라고 한다. 바위를 뚫고 솟아오른 신비로운 나무 한 그루가 드리우는 상큼한 그늘, 나무가 드리우는 그늘이야말로 하늘이 지은 정자였다. 저절로 좋은 글을 쓰게 만드는 자리라는 뜻에서 바위에 붙여진 이름이 ‘문암’이었다.
누구는 이 소나무의 나이가 300년이 됐다고, 또 누구는 600년도 넘었다고 말한다. 나무의 나이를 정확히 가늠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무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물이다. 물 한 모금 스며들지 않는 바위 위는 진천 석현리 느티나무와 마찬가지로 나무가 생명을 이어가는 데 최악의 조건이다. 양분이 충분치 않은 생육 조건에서 자라는 나무의 나이를 비옥한 땅에 터잡은 나무들의 크기와 비교해 짐작할 수 없다.
나무는 사람들의 눈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천천히 자랐다. 봄이면 송홧가루를 날리고 가을에는 솔방울을 맺으면서 차갑고 견고한 바위 위에서 제 몸을 키웠다.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고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살아온 나무는 높이 12m, 줄기 둘레 3m의 헌칠한 소나무가 됐다.
살아남기 위해 나무는 바위를 파고들었지만 바위가 바스라지지 않도록 조금씩 자라야 했다. 다른 소나무가 한 아름 자라는 동안 이 나무는 고작 한 뼘쯤 자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바위까지 쪼개야 했지만 바위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도록 온 힘으로 변증의 생명을 이어와야 했다.
하동 축지리 문암송이나 진천 석현리 느티나무가 살아온 곳이야말로 나무로서는 극한의 환경이다. 그러나 나무는 살아야 했다. 돌아보면 산다는 건 나무나 짐승이나 매한가지다. 언제나 평안함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곤 하지만 평안은 쉬이 찾아오지 않는다. 제 안의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느냐에 따라 생명의 아름다움과 평안의 크기가 결정된다.
안으로는 생살이 찢기는 아픔에도 바위를 쪼개야 하고, 밖에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도록 바위를 붙들어 안고 살아가는 변증의 생명력이 놀라울 뿐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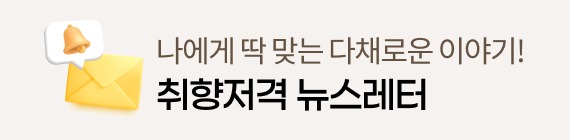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르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615111741444_1713247877.jpg)


![[시론]국민의힘 위기의 진짜 본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907435942966A.jpg)
![[디펜스칼럼]무섭게 성장하는 日 방산기업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911205793276A.jpg)
![[기자수첩]'기후플레이션' 보조금에만 기댈건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910292631627A.jpg)






![[포토] '그날의 기억'](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1909431345253_1713487393.jpg)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808095443462_1713395394.jpg)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709294142287_1713313781.jpg)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13008484747604_1706572127.jpg)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120715170080899_1701929820.jpg)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31909291699376_1710808157.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