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슴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신문의 소중함을 알기에 나는 대학생에게 신문 읽기를 권한다. 개강할 때는 습관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는지 조사해 보곤 한다. 대개의 경우 70여명의 학생 중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학생은 서너 명 정도인데 부모가 구독하는 신문을 '더부살이'로 보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20대 대학생의 경우 구독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다. 신문의 위기를 넘어 파산 수준이다.
사실 신문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8대 신문의 경우만 해도 2013년 매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신문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기사를 담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과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신문협회는 지난 17일 협회보를 통해 '포털이 뉴스를 매개로 얻은 광고수익 등 부가가치를 신문협회가 주축이 된 공동협상을 통해 포털과 신문사가 공유해야 한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네이버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독점적 지배력이 커질수록 반대로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사가 위축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과의 수익 공유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문의 근본적인 위기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향후 포털과의 관계 설정이나 기사를 담는 매체의 진화와 기사의 제공 방식에 대한 전략 없이 신문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문사는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본의 과점적 포털인 야후에서는 신문기사가 검색되지 않는다. 신문기사를 보려면 해당 신문사 사이트에 들어가야 한다. 더구나 닛케이(일본경제신문)의 경우 과거의 기사를 검색하려면 유료 회원이 돼야 하고, 한 달에 무려 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닛케이는 경제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급정보를 보유하고 있기에 필요한 사람은 싫어도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닛케이는 지금 단순 지면 제공을 넘어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의 독자적인 디바이스로 진화시켜 가고 있다.
신문의 기회는 또 있다. 그것은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 너무도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PC와 인터넷 포털을 넘어 이제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중요한 디바이스가 됐으며 기사를 담는 형식도 다양화해 페이스북의 페이퍼나 플립보드가 등장하고, 카카오토픽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앱)은 콘텐츠를 담는 그릇으로, 그릇에 들어가는 음식물(콘텐츠)까지 직접 그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신문기사는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장인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음식인 것이다. 다양한 디바이스와 포맷이 등장할수록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만드는 신문사의 중요성은 커진다.
문제는 신문사가 자신의 어떤 음식을,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의 부재로 인해 지금 신문사는 최대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전할수록 기사의 중요성은 커지지만 정작 기사를 만드는 신문사는 위기에 몰리는 패러독스인 것이다. 이 패러독스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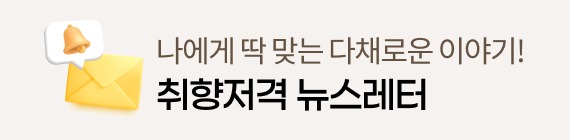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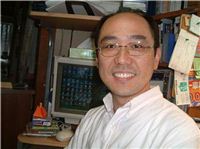
![[뷰앤비전]해외건설, 수주경쟁력 확보 노력할 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4121715512011331_1.jpg)








![잠시 쉴 틈도 없는 치매 보호자…'하루 1만원' 내고 휴가 보내줄도 알아야[노인 1000만 시대]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515134639824_1713161625.jpg)







![[초동시각]제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511111216547A.jpg)
![[시시비비]경영권 지킨 디즈니와 'PC주의' 논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513390549754A.jpg)
![[특별기고]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주는 투자 기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513464837251A.jpg)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410323050257_1713922350.jpg)
![[포토] '그날의 기억'](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909431345253_1713487393.jpg)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808095443462_1713395394.jpg)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510502452065_1714009823.png)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415131250718_1713939192.jpg)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042111281396915_1682044092.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