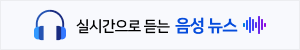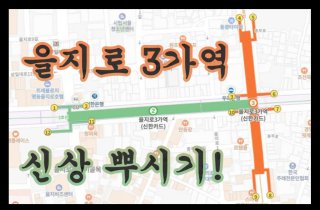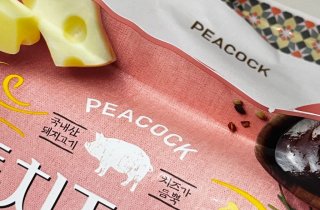등기부 깨끗하면 대항력으로 회수 가능성 높아
피해 임차인 A씨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도 입주 당시 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등기부가 이상이 없다는 의미는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에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설정,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선행 임차권, 신탁등기 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대항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를 기초로 강제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전세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
대항력을 보유하면 임대인 교체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소유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매 낙찰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한다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경매 절차가 진행돼 낙찰자가 등장해도 임차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항력의 효과로 낙찰자는 전 소유주와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승계(인수)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주택의 명도(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를 거부하면서 낙찰자로부터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된다. 통상 낙찰자는 투자 또는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경매 용어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을 알고 입찰에 참여하므로 전세사기 가담자인 소유자보다 경제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격 싸다고 덜컥 경매 낙찰받으면 낭패
다만 임차인은 단지 가격이 저렴해 보인다는 이유로 덜컥 입찰에 나서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인수할 전세보증금액을 합산할 경우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입주 당시 매매시세를 2억원, 여러 번의 유찰을 거쳐 최저입찰가격이 70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7000만원은 싸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2억원짜리 부동산을 경매에서 2억2000만원(낙찰가 7000만원 + 인수할 전세보증금액 1억5000만원)에 비싸게 사는 셈이라 무턱대고 입찰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오히려 임차인은 최저입찰가격이 500~1000만원(배당절차에서 이 경우 경매 비용 300~500만원을 제외하고 선순위인 조세채권자가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준)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입찰해야 유리하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은 응찰자가 적기 때문에 ‘단독입찰’로 소유자가 될 기회가 많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최저입찰가격이 경매 비용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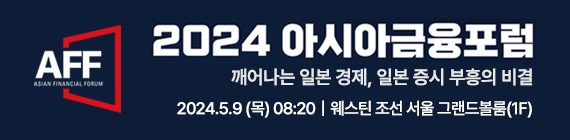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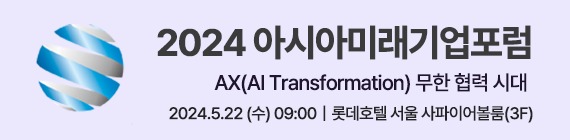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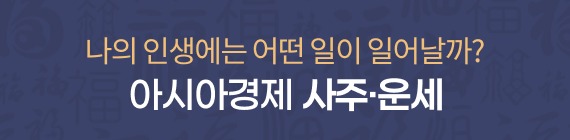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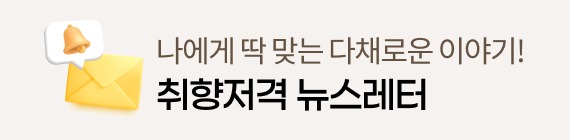
![[전세살이ABC]보증보험 가입 못 해도 등기부 이상 없으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11014363779358_1673328998.jpg)

![[전세살이ABC]“이사 먼저, 보증금 나중에”…‘담보’ 포기하는 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23021419280824160_167637048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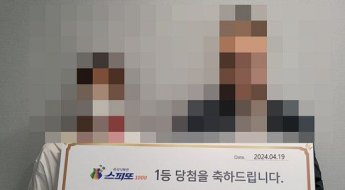







![잠시 쉴 틈도 없는 치매 보호자…'하루 1만원' 내고 휴가 보내줄도 알아야[노인 1000만 시대]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1515134639824_171316162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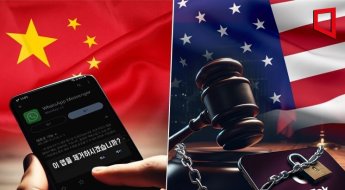



![[초동시각]제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511111216547A.jpg)
![[시시비비]경영권 지킨 디즈니와 'PC주의' 논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513390549754A.jpg)
![[특별기고]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주는 투자 기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42513464837251A.jpg)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410323050257_1713922350.jpg)
![[포토] '그날의 기억'](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909431345253_1713487393.jpg)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1808095443462_1713395394.jpg)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113/2024042510502452065_1714009823.png)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4042415131250718_1713939192.jpg)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042111281396915_1682044092.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